눈 오는 날, 강아지가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안내한 이야기
눈은 처음엔 “조용한 축복”처럼 내렸다.
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잠깐 웃었다.
“와… 눈 온다.”
“오늘은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.”
하지만 눈은 곧,
세상을 ‘하얀 장난’이 아니라 하얀 함정으로 바꿔놓는다.
길이 흐려지고, 표지판이 사라지고,
어제까지 익숙했던 골목이 낯설어진다.
그리고 그날,
그 눈 속에서 한 아이가 길을 잃었다.
아이의 손은 장갑 속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.
눈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눈을 찡그렸고,
숨은 자꾸 하얗게 끊어졌다.
아이의 목에는 스카프가 있었지만
그 스카프는 따뜻함이 아니라 불안을 감싸고 있었다.
“엄마가… 여기서 기다리랬는데…”
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잘려 나갔다.
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불빛이
어느새 전부 사라져 있었다.
길은 복잡하지 않았다.
그저 하얗기만 했다.
그때였다.
아이가 뒤쪽에서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.
눈 밟는 소리는 무겁고 둔한데,
그 발소리는 이상하게 가볍고 조심스러웠다.
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.
거기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.
몸집은 크지 않았지만
눈 위에서 균형을 잡는 걸 보면,
이 강아지는 이미 겨울에 익숙한 녀석이었다.
꼬리는 반쯤 올라가 있었고,
눈동자는 마치 아이를 “평가”하듯 조용히 살폈다.
이 아이, 지금 어디 가는 거지?
강아지는 다가오지 않았다.
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아이를 바라봤다.
가끔 고개를 기울였다.
그리고는 한 번… 딱 한 번,
작게 “멍” 하고 울었다.
그 울음은 경계도 아니고, 인사도 아니고,
어쩐지 이런 말처럼 들렸다.
“거기서 그러고 있으면… 더 추워져.”
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.
“나 길을 잃었어…”
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.
하지만,
그 순간 강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.
그리고는 천천히, 아주 천천히
아이 앞을 지나 골목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.
몇 걸음 걷고—
다시 뒤를 돌아봤다.
아이를 확인하듯.
따라와.
일단 따라와.

아이는 처음엔 움직이지 못했다.
낯선 강아지를 따라간다는 게 무섭기도 했다.
하지만 더 무서운 건
이대로 서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.
그래서 아이는
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.
눈이 ‘뽀드득’ 하고 울었다.
강아지는 다시 앞장섰다.
강아지는 빠르지 않았다. 아이가 따라올 속도로 걸었다.
강아지는 뛰지 않았다.
아이가 따라올 속도로 걸었다.
너무 빠르면 아이가 넘어질 테니까.
너무 느리면 아이가 얼어붙을 테니까.
강아지는 이상하게도
그 속도를 알고 있었다.
중간중간 멈췄고,
가로등 아래에서는 잠깐 서서 주변을 살폈다.
그리고,
한 번도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.
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울지 않았다.
왜냐하면 눈물보다 더 큰 감정이
가슴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
“나… 혼자가 아니구나.”
아이의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.
눈은 길을 지웠지만, 강아지는 마음을 지우지 않았다.
강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
그저 눈 사이를 헤치며 걸어갔다.
세상이 하얗게 변해도
이 강아지의 길은 선명했다.
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.
강아지가 갑자기 멈췄다.
그리고 고개를 들어
어떤 집을 바라봤다.
현관 불빛이 켜진 집.
갑자기 문이 열리더니
여자가 뛰어나왔다.
“민준아!!!”
그 목소리는 겨울을 찢었다.
눈도, 바람도, 공포도 모두 찢었다.
아이의 몸이 풀렸다.
“엄마…!”
아이의 다리는 힘이 빠져
주저앉아버릴 것 같았다.
엄마는 아이를 안고
몇 번이고 얼굴을 확인했다.
“괜찮아? 어디 갔었어?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…”
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,
그 눈은 이상하게 반짝였다.
아이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갔다.
“엄마… 저 강아지가…”
하지만 그때.
강아지는 이미
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.
자기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,
그리고 너무 티 나면 민망한 사람처럼.
강아지는 아이와 엄마를 바라보며
꼬리를 한 번 살짝 흔들었다.
그 움직임은
인사라기보단…
“이제 됐지?”
그런 느낌이었다.
엄마가 강아지를 발견하고
놀라서 외쳤다.
“어머! 강아지야! 너… 너였구나?”
엄마는 주머니를 뒤졌다.
강아지 간식이 있을 리 없었다.
대신 손바닥 위에는 따뜻한 호빵이 하나 있었다.
엄마가 조심스럽게 내밀었다.
“이거… 먹을래?”
강아지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
딱 멈췄다.
그리고는 호빵을 바라보는 대신,
엄마의 눈을 먼저 바라봤다.
잠깐의 침묵.
그 짧은 순간,
엄마는 이해했다.
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구나.
일을 하러 온 거구나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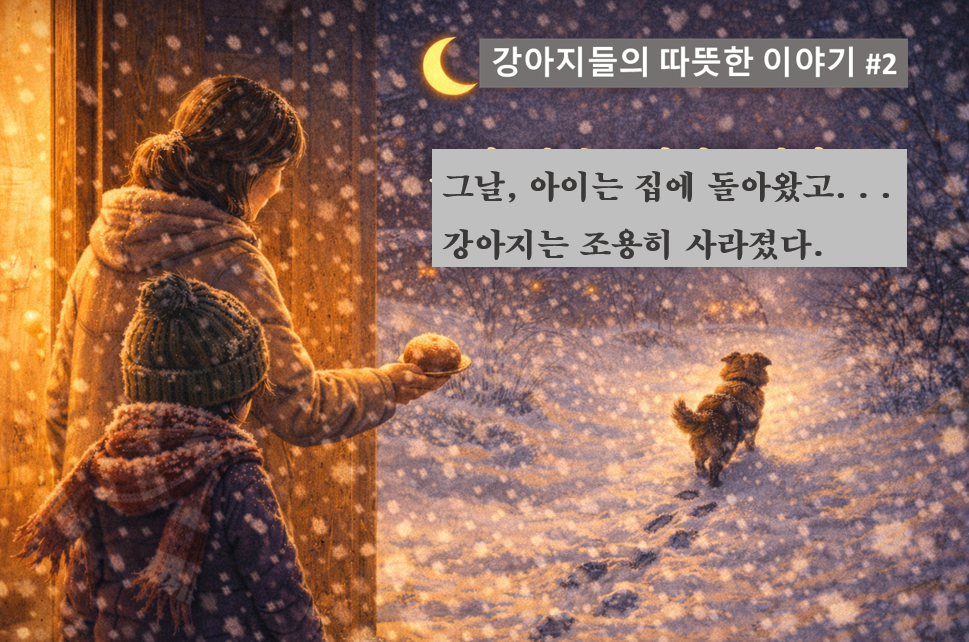
강아지는 호빵을 먹지 않았다.
대신 한 번 더 꼬리를 흔들고
눈 속으로 몸을 돌렸다.
그날, 아이는 집에 돌아왔고… 강아지는 조용히 사라졌다.
그 뒷모습이 어쩐지
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.
아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다.
“엄마! 강아지 고마워!!”
아이의 외침이 눈 속으로 퍼졌다.
강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.
그냥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.
아마 들었을 거다.
강아지는 다 들었을 거다.
그날 밤, 아이는 잠들기 전에 말했다.
“엄마… 강아지는 천사야?”
엄마는 잠깐 생각했다.
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.
“천사는… 가끔 강아지로 오기도 하더라.”
🌙 맺음말
강아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.
강아지는 길을 만들어줬다.
눈이 모든 걸 지웠던 날,
그 강아지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
세상에 아주 작은 선 하나를 그려줬다.
그 선의 이름은
함께 걷는 마음이었다.
'겨울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겨울철 강아지들의 이야기 4편 - 한겨울 새벽,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(0) | 2026.02.22 |
|---|---|
| 강아지들의 따뜻한 이야기 3편 - 추운 날씨, 노령견의 작은 용기 (0) | 2026.01.29 |
| 강아지들의 따뜻한 이야기 1편 - 겨울을 함께 보내는 반려견 이야기 🌙 (1) | 2026.01.11 |
| 겨울철 반려견 실내 놀이 & 활동량 유지법 — 추워도 건강하게 움직이는 집 안 루틴 🐶 (0) | 2026.01.09 |
| 겨울철 반려견 건강 체크 리스트 - 보호자가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🐶 (0) | 2026.01.07 |